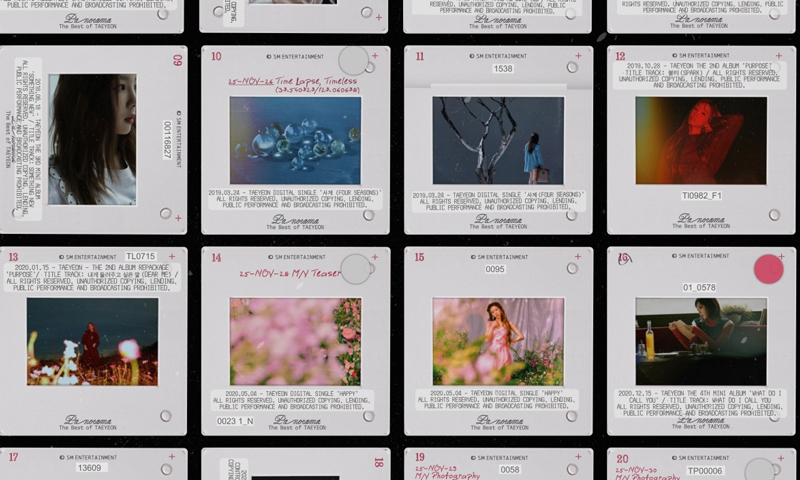홍명보 감독은 지난해 7월, 생애 두 번째로 축구 A대표팀 지휘봉을 들었다. “나는 나를 버렸다”는 출사표에는 10년 전 2014 국제축구연맹(FIFA) 브라질 월드컵에서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의가 담겼다. 2026 북중미 월드컵이 눈앞에 왔다. 10년의 동안 쌓인 오답노트를 펼칠 때다. 홍명보호는 무엇이 달라졌을까.
부임 과정, 잡음 속에 지휘봉을 잡았다. 부진 속 여론의 뭇매를 맞은 조광래 전 감독과 소방수 역할만 원했던 최강희 전 감독을 이어 급하게 자리를 물려받았다. 선수 시절 월드컵 무대를 밟아 본 경험과 2012 런던 올림픽 동메달 기적을 일군 23세 이하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 경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다만 시기상조라는 우려가 줄을 이었고, 과감한 도전은 참혹했다. 정식 감독에 선임된 2013년 6월부터 연말까지 3승3무4패의 아쉬운 성적을 썼다. 공수 모두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2014년은 잊고 싶은 한 해가 됐다. 미국 전지훈련과 평가전에서 2승4패로 흔들리더니, 월드컵 본선 최하위(1무2패)로 조별리그 탈락을 맛봤다. 1998 프랑스 월드컵(1무2패) 이후 최악의 성적표, 스스로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
선수들의 레벨을 공개적으로 구분 짓는 ‘B급 선수’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고, 실전 감각이 떨어진 박주영·윤석영 등 몇몇 선수들을 향한 근거 없는 신뢰로 ‘의리 축구’ 오명을 썼다. 딱딱한 엔트리 운영 속에 신구조화도 무너졌다. 원팀을 외쳤지만, 결국 원팀을 만들지 못했다.


강산이 변하고서야 설욕의 찬스를 잡은 홍 감독, 변화가 없던 건 아니다. 엔트리 유연성에서는 개선이 감지됐다. 선수 몸 상태와 컨디션에 따라 소집명단을 유동적으로 활용했다. ‘뉴 페이스’ 옌스 카스트로프, 양민혁, 권혁규, 이한범, 이태석 등을 활용해 다양한 조합을 실험하며 최소한의 성과를 거둔 배경이다. 올해 A매치 8승3무2패를 남겼다.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 사상 첫 조 추첨 포트2 진입 등 선굵은 이정표도 세웠다.
다만 시선은 여전히 차갑다. 선임 과정의 불투명성, 아무리 해명을 해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10년 전과 달리 승률이 높아도, 무색무최 전술은 10년 전과 똑같다는 지적이 줄을 잇는다.
전술적 변화도 있다. 월드컵 예선에서는 공격적인 포백을 꺼내다가, 본선 확정 후로는 강팀을 상대할 수비적인 스리백을 활용했다. 4-2-3-1 포메이션만 고집해 비난 받던 1기 시절과는 달랐다. 다만, 디테일 부족은 여전하다. 중원 압박-빌드업으로 이어지는 과정의 섬세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편성이 완료되면 상대에 대한 면밀한 파악과 분석도 잊지 않아야 한다. 2014년 대회에서 상대적으로 쉬운 조(벨기에·알제리·러시아)를 받아들었지만, 방심 끝에 무너졌던 홍 감독이다. 특히 최약체 알제리에 당한 2-4 대패는 치욕의 참사로 남아있을 정도다.
월드컵까지 남은 반년, 모든 문제의 답을 찾아야 한다. 홍 감독은 “(2014년은) 지금과 비교하면 많은 차이가 있다”며 “당시엔 선수 파악에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지금은 충분하다. 월드컵에서 필요한 부분을 준비하겠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한국 축구 역사상 최초로 월드컵 재수 기회를 받은 사령탑이다. 더 이상의 핑계는 없다.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portsworld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