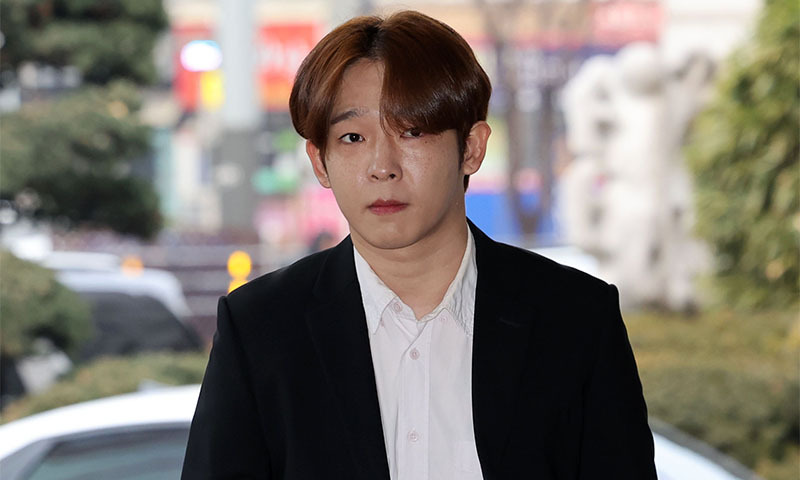0.01초 뒤진 은메달리스트와 1분30초나 뒤진 예선 꼴찌, 누가 더 아름다웠을까.
스포츠 빅 이벤트는 많은 ‘국민 영웅’들이 스포트라이트를 가져간다. 환한 미소와 함께 반짝 빛나는 메달이 사진을 가득 채우고, 그 사진들이 포털과 SNS, 신문 1면을 휩쓴다.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도 그랬다. 하지만 단 한 번의 찰나가, 그 모든 환희의 순간을 뒤덮었다.
지난 2일이었다. 롤러스케이트 남자 3000m 계주에서 뜨거운 감자가 된 ‘0.01초’가 등장했다. 최인호(논산시청), 최광호(대구시청), 정철원(안동시청)으로 구성된 한국 대표팀은 좋은 질주를 펼쳤고, 결승선을 코앞에 뒀다. 마지막 주자 정철원은 머릿속을 채운 금빛에 취해 두 팔을 들고 기쁨에 젖었다. 그때 그를 쫓던 대만의 황위린이 왼발을 쭉 뻗었다. 그 간절한 발끝은 0.01초짜리 차이로 금색과 은색을 뒤바꿨다. 누군가에게는 대역전극이자 누군가에게는 역사에 새겨질 희대의 촌극이 됐다.
금메달로 누릴 한없는 영광과 병역특례라는 달콤한 혜택을 잃었다. 당사자들의 심정은 오죽할까. 얼마나 가슴 아플지 상상도 되지 않는다. 그러나 동정과 별개로 비난은 피할 수 없다. 개인전도 아닌 동료들과 함께 일군 단체전이다. 그리고 가슴에는 누군가의 꿈이었을 태극마크가 붙어 있다. 눈앞에 닥친 금메달의 환희를 일반인들이 가늠하긴 어렵겠지만, 어이없는 방심으로 그걸 놓치고 억울해하는 표정을 보고 있는 건, 같은 국민으로서 다소 부끄러워지는 게 사실이다.

장면을 곱씹다 문득, 수영 예선을 보러 갔던 항저우 올림픽스포츠센터 아쿠아틱 아레나가 떠올랐다. 지난달 24일이었다. 황선우를 비롯한 수영 대표팀을 지켜보려 기자석에 앉아 있었다. 그러나 눈길을 사로잡은 순간은 따로 있었다.
예선에 출전한 ‘수영 변방 국가’ 선수들의 레이스가 한없이 뒤처졌다. 여자 접영 200m의 라디프 메럴 아인(몰디브)은 예선 1위와 57초 차이가 났다. 여자 1500m의 니키스키나 안나(키르기스스탄)도 그랬다. 함께 레이스를 펼친 조1위는 그를 1분32초51동안 기다려야 했다.
이 일을 시작하기 전, TV로도 자주 봤던 장면이지만 직접 보는 것은 또 다른 감상을 선사했다. 일상에서 컵라면도 익지 않는 짧은 시간이지만 그들을 기다리는 1분30초는 어느 때보다 길었고 무척이나 고요했다. 포기하지 않는 역영의 순간순간이 가슴에 깊이 박혔기 때문일 것이다. 그 장면을 보던 사람들과 함께 격려의 박수를 건넬 수밖에 없었다.
환대를 받고 물 밖으로 나오는 선수들의 표정에는 아름다운 미소가 있었다. 같은 대회를 뛸 수준이 아니라는 냉정한 뜻이 될 수 있는 1분 반이지만,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의 열정과 그걸 인정하는 팬들의 박수 덕에 무엇보다 의미가 깊은 1분 반이 됐다. 꽤 감동적인 순간이었다.
세상이 사라질 때까지 남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요기 베라의 명언을 다시 떠올려 본다. 비난밖에 받지 못하는 은메달리스트의 0.01초와, 우레와 같은 환호를 받은 꼴찌의 마지막 90초도 다시 떠올려 본다. 스포츠의 진짜 매력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항저우=허행운 기자 lucky77@sportsworldi.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portsworld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단독] 차은우, 올해 군대 간다](http://img.sportsworldi.com/content/image/2025/05/10//20250510500884.jpg
)
![NCT 위시, SM콘 불참 이유 [공식]](http://img.sportsworldi.com/content/image/2025/05/10//20250510505378.jpg
)